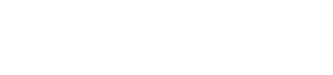대학 입학 후 가장 먼저 지원한 한신학보. 나는 총 두 번 한신학보에 지원했었다. 처음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두 번째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찾아본 후였다. 앞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첫 지원은 불합격이었다. 6개월 후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했다. 다행히도 1차 합격 문자를 받았고 2차 면접 이후에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다.
한신학보는 기자들은 수습기자, 정기자, 각 부서 부장 그리고 편집국장으로 구성돼있다. 신입 기자들은 입사 후 한 학기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수습 기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함께 입사한 세 명을 제외하면 기존 기자들도 세 명으로 인원 부족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양의 기사를 맡게 됐다. 업무를 익히고 기사를 다듬어가는 기간이 가장 힘들고 학보사 스케줄과 기사 문체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낸 신문은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해줬다. 내가 직접 취재하고 쓴 기사가 이름과 함께 나와 있는 첫 신문을 봤을 때 느낀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수습기자와 정기자 과정을 거치고 대학부장 직책에 오르게 됐을 때는 불안함이 앞섰다. 대학부장은 말 그대로 대학부 기사에서 나오는 모든 기사를 확인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기자들의 기사를 피드백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익혀나가니 천천히 해소되기 시작했다. 조금 더 취재하면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욕심도 생겨났다. 후임 기자들 기사를 확인해주면서 내 기사를 작성하는 실력도 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쓴 기사가 총학생회 구성 무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위기 내용이다. 대학부장이 되기 전부터 편집국장 활동을 끝내기까지 우리학교 총학생회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다.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직책을 가진 학생들과 인터뷰한 것은 딱 한 번뿐이다. 아직도 이런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학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총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기자들은 대부분 학생 입장을 총학생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해 듣고 기사를 작성한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일 때는 정확한 답변은 듣는 게 힘들다. 비대위도 총학생회의 대체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번 말했지만 역시 학생들의 관심이 총학생회를 일으킬 가장 큰 힘이다.
한신학보는 한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새로운 인재를 찾는다. 602호가 발간되는 9월 역시 수습기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보사 하면 취재와 마감이 힘들고 고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와 함께 얻어가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약 3년 동안 수습기자, 정기자, 대학부장, 편집국장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힘들었지만 즐거운 기억이 더 많다. 이제 더 이상 학보에 글을 싣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남아있는 우리 학보사 기자들 그리고 새로 들어올 수습기자가 있음에 미련 없이 떠나고자 한다.
운이 좋게도 일 년 뒤에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내가 편집국장이 된 후 가장 잘한 일을 생각해보면 온라인 발간에 성공했다는 거다. 사실 한신학보는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발간에 대해 논의해왔다. 하지만 신문은 그래도 종이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과 충돌하면서 제대로 추진되는 게 어려웠다.
직속 편집국장 선배는 학생들도 종이보다 인터넷으로 더 많이 찾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간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편집국장 된 후에는 준비된 온라인 발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본부 측과 여러 번 회의 끝에 한신학보는 새로운 온라인 채널을 만들었다. 기존 9번 종이 신문 발간과 다르게 개강호, 종강호를 제외한 모든 신문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정말로 <한신학보>에 남기는 기사의 끝이 보인다. 602호를 시작할 때 느낌을 묻히고 싶어 회의 직후부터 작성한 이 칼럼은 마감하고 있는 지금까지 손에서 놓치 못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와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어 도전했던 학보사 기자로써의 활동은 졸업과 함께 끝이 난다. “난 이제 끝이다”라는 후련함과 동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진
행하는 회의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만 했는데 아직은 어색하다. 이번호가 끝나고 누군가 다음호에는 어떤 기사를 써야할까라는 고민을 말해주고 있을 것 같다.
수습기자, 정기자, 대학부장, 편집국장 과정을 거치면서 글을 쓸 때 습관도 생겨났고 기사 속 표현력도 풍부해진 것 같다.나는 이제 끝이지만 <한신학보>는 남아있는 기자들이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이다.
| 김하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