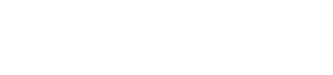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자살이 잇따라 보도된다.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관련 법안 이 국회 문턱을 넘어가려 하는 와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자살행렬은 이어진다. 당장의 고통 앞에 서 있는 교사들에게 이제 막 시작되는 교권 회복의 움직임은 소용없다. 죽음에 이른 교사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지난 30년간 대다수 언론과 국민은 학생 인권에 주목했다. 1980년대까지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그야말로 ‘군사부일체’였다. 학생에게 인권과 자율성이 있다는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인 시절, 교사의 권위 앞에서 많은 학생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반전됐다. 교사는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혼내지 못한다. 교사를 폭행하거나 조롱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학부모는 수업 중인 교사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소리치기에 이른다.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학생 인권 보장이 구체화 됐다.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증진한 것이 교권 추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당하지 못한 송사에 휘말리며 고통받는다.
학대라는 물리적 용어의 기준은 모호하다. 교사의 꾸지람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학대가 되기도, 생활지도가 되기도 한다. 그 기준은 사랑하는 자식을 세상 밖으로 내놓은 부모 앞에서 더 쉽게 흔들린다. 어느 쪽이든 도덕적 판단을 배제한 채 그로 인한 자식의 불리함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
결국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된 이 삼각관계는 엉켜간다. 교실은 그야말로 대립의 장이다. 교권 침해인지 학생 인권 침해인지 따져가며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이어 나간다. 교사의 교육철학은 무시되며 학생이 ‘진짜 가르침’을 받을 기회는 사라진다. 교실에는 교육이 아닌 지식의 형식적인 전수만이 남는다.
교권과 학생 인권, 이 둘의 관계를 올바르게 구축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어느 한쪽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또다시 온다. 가령 교권 회복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지금, 교권을 되살리는 것에만 과도하게 매몰된다면 정말로 구제받아야 할 진짜 학대는 가려질지도 모른다. 교권의 회복이 학생 인권 후퇴라는 역행을 가져와선 안 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지도에는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대립적으로 비치는 두 권리의 관계를 타파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