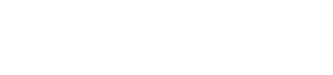시인 겸 철학자 유진 새커의 『이 행성의 먼지 속에서: 철학의 공포』에서 저자는 자신의 취향을 문화사적이고 존재론적인 연구와 적극적으로 혼합하려고 한다. 그는 고딕 소설과 공포 문학, 20세기와 최근의 공포 영화와 재난 영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공포의 대상들을 유형화하고 이를 자기 자신과의 토론을 통해 이론화하면서 느슨한 시적 이론을 펼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체가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익명적 공포에 관한 담론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 근거로, 그는 고전적인 괴수 영화들(좀비, 흡혈귀, 악마, 유령 영화들)과 대별되는 ‘거기 있음’의 공포를 제시한다. 가령, , <크리처The Creatures>, , , , , , , Thing> 등의, 이름을 확정지을 수 없는 공포의 대상들에 관한 영화 제목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 ‘새로운’ 종류의 공포가 어떻게 실체도 없고 전통적인 인식론으로부터 미끄러져 나가면서 ‘존재-없는-생명’으로 묘사되는지 기술한다.
그의 철학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책을 나름대로 재미있게 읽은 것은 그의 취향이 우리 세대 공통의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마치 조지프 히스와 앤드류 포터의 『혁명을 팝니다』를 읽을 때, 그 책이 기 드보르와 너바나와 급진적인 자율주의를 비판적으로 쓰면서도, 저자들이 한때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절실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유진 새커가 자기의 악취미를 시적 철학으로 만드는 작업이 같은 세대인 나에게 공통감각에 의한 애정과 모종의 유보적 감정을 남겼던 것이다.
하여간 공포영화로 철학의 공포를 해명하려 했던 저 책을 읽으면서 나는 아무래도 아무 데에도 싣지 못할 기획을 구상했는데, 그것은 20세기 말 한국의 담배 이름으로 당대의 정신사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한 것이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나는 20세기에는 비흡연자였다.)가령, 1980년대의 담배 이름들은 대개 서정성이나 호연지기를 표현했다. <도라지>, <장미>, <라일락>이 서정성 쪽이라면, <솔>, <한라산>, <거북선>은 위풍당당한 기상과 절도를 더한다(장군이 군 통수권자인 세상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 갑자기 몹시 철학적인 담배 이름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다. 과 는 붙여놓으면 하이데거 책 제목이 될 것이다. 는 지칭이론의 온갖 문제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은 ‘서정성? 호연지기? 감상 따위 버리고 생각을 해!’처럼 들린다. 은 <하나로>와 비슷한 맥락인가 싶겠지만, 후자가 어쩐지 민족주의적으로 들리는 데 반해 전자(一者?)는 형이상학적으로 들린다. 물론 며 <88> 같은 국가적 행사 이름을 딴 담배들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기는 했지만, 저런 철학적인 이름들의 동시다발적인 등장과, 무엇보다 이것들이 모두 ‘재가 되어 사라질 것’에 대한 은유라는 점을 떠올리면 심상치가 않다. 분명 한국담배인삼공사 기획/영업부의 인적 구성에 뭔가 큰 일이 벌어졌거나 당시 소비자들의 심사가 몹시 허탈해진 상태라는 것을 시장 조사를 통해 깨달았거나, 당시 가장 잘 팔리던 소설이 『상실의 시대』, 가장 잘 팔리던 시집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존재론적인 이름의 담배(Time, The One, Esse, This)들은 여전히 잘 팔리는 데다 특히 는 다양한 변형으로 편의점을 점령하고 있다. 진실로 ‘이 행성의 먼지 속에서’ 먼지처럼 스러지는 우리에게 저, 재가 되어 사라지는 ‘존재’라는 이름의 담배 연기야말로 <시나브로> ‘존재-없는-생명’처럼 여겨지기 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