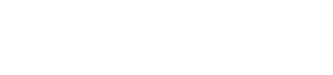어느새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었다. 올해만 지나가면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니다. 나는 문예 창작을 전공했고, 그중에서 시를 쓰고 있다. 전공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잡힌 이 시점에서 내게 시를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으레 그러하듯 무언가를 하는 것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시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조금은 직설적이지만, 살기 위해서였다.
당시 몹시 힘든 시간을 지날 때였다. 관습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나에게는 나의 이야기를 할 언어가 필요했고, 그 언어가 내게는 시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시는 어떤 이야기이든 세상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무한한 내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에 손색이 없다. 불과 몇 년 전의 나는 자주 우울했고, 자주 슬퍼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하는 것은 실례가 되는 행위였다.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나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이 나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홀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는 마음들을 시로 담아내었다. 가끔 그때 썼던 시의 온도를 느낄 때면 당시의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스러운 마음이 든다. 때로는 그것이 시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발악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나를 살게 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나라의 외국인을 대할 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듯이 내면의 이야기를 사용할 때 쓰는 언어도 실생활의 언어랑 다를 것이다. 나는 그것을 혼동하여 원치 않은 슬픔을 마주했지만, 지금은 둘을 구분할 줄 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시가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는 나의 호흡을 도와주는 대상이다. 대학교 2, 3학년 때는 시가 나에게 어떠한 대상인지 가늠이 가지 않아서 스스로 고민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시가 내게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내게 시가 어떠한 의미였는지까지 말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소중하고 왜 뜻깊은지 깨닫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대학교에 다니는 내내 문학이 무엇인지 시는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것들은 나를 살게 하는 ‘언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힘겨운 삶을 지나왔기 때문에 나는 언어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우리에게는 모두 언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저마다의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는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다. 나를 살게 한다는 문장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나만의 언어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문학이든 무엇이든 좋으니깐 자신의 언어를 가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더 큰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었으면 좋겠다.
| 윤우 (문창‧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