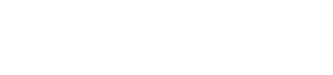인간이란 사진가이며 사회란 앵글 안의 장면들과 같다. 나는 앵글 밖의 사진가와 앵글 안의 장면들을 함께 생각한다. 그것이 사회를 유일하게 이루는 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진의 구도와 다채로운 채도와 명암에 주목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가가 장면들과 동시에 생성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즉 사람들 자신은 자신의 관찰을 통해 여전히 그 공간 안의 인간들이 존재하고 관계를 맺지만, 나는 그 속에 없다. 왜냐하면 내 사유의 접근 권한은 사회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앵글이 사진가 바깥에 존재한다고 상정한다. 그 결과 사유 안에서 출발한 인간에게 사회 안에서 출발할 권한은 없다.
인간의 체계에서 출발하는 독립성에서 그 환경들인 타자와 사회의 자율성을 요구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자아, 타자, 사회 세 가지가 모두 환경에서 동시에 출발할 수 있다는 가정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자에 관한 실존성 추구, 사회의 저항 정신, 문학적 낭만주의는 모두 사회 속 귀속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동일한 상정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해당 시작점으로는 사회적 소통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모든 권역의 학문이 이와 동일하다.
기자란 음압의 사명을 지닌 자이다. 현장에서 가장 두껍게 느껴지는 것이 음압의 소통이다. 당신은 왜 기자를 지원했는가? 나는 기자가 영혼을 내던지는 역사를 취재해야 한다는 당연히 다짐하고 있을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여기서 ‘인간은 사회의 요소가 아니라, 사회의 환경’이라는 루만을 상기한다. 그렇다면 기자란 단순히 앵글 내의 사회의 저항 정신을 취재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의 출발점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 증대를 표현하는 자이다. 나는 이러한 정신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인공 디덜러스와 연결된다고 판단한다. 책 막간의 세 단락은 단순히 침잠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차분하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것과 사회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인 소통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내가 품어온 책 속에는 3,840픽셀 구도 안에 담아온 그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공간에서 항상 카메라 위치 뒤에 있는 그에게 “어떤 조형 요소를 담고 싶으세요?”라고 묻고 싶었다. 어느 편지 속에서, 그 기록을 위해 사라지는 많은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그 장면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품어온 장면을 덜어내는 고통을 작가와 나눴다. 그 장면 안에 앉아 있는 두 번째 십진 분류를 자아낼 당신에게도 묻고 싶었다. “오늘 대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나요?” 내 이야기도 디덜러스와 같은 소통이다.
나는 판단 유보 최후의 보루 속에 사진가의 자유를 마땅히 인정할 것을 원한다. 마치 농후한 카뮈 곁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사회자로 자리한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시종일관의 침착함을 대화를 통해서 신뢰하게 될 것이다. 어떤 선배는 내가 “자기 생각을 건드리는 자“라며 글을 쓰게 하는 자라고 한다. 어떤 동기는 나를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라는 보고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었는가? 사회 안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절필 속에 품어온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