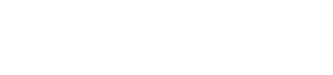세상 사람들을 나누는 이분법의 기준에 이것을 포함해도 좋을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는 전자의 입장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지레짐작했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쩌면 종교적인 이유에서, 혹은 운명론적인 이유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해보고 싶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당신과 가까운 타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히라노 게이치로는 ‘나’란 나눌 수 없는 개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 즉 ‘분인’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신형철 평론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따라서 그를 잃는 것은 그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나의 분인 마저 잃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모든 나 자신까지 잃어버리는 것.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나의 일부가 죽는 일이다. 내가 죽은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도 살아있는 육체의 감각은 선연하도록 생생한 상태는 과연 어떨까. 그 간극에서 오는 비참함을, 누군가를 잃어본 적 없는 나는 알 길이 없다.
어쩌면 그 알 길 없음이 문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기분을 모른다. 수많은 비보와 이야기를 통해 간접 경험할 뿐이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의 무심함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 생각하면 조금 서글퍼진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고 있으니까. 남겨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은 것과도 같은 슬픔에 빠져 있을 테니까. 나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어떤 비극 앞에서는 어떠한 행동과 말도 무용해지고 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나의 일에 대입해 보는 것뿐이다. 나와 닮은 인생을 살던 누군가의 돌연한 죽음과 남겨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삶에도 느닷없는 비극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공감의 영역이란 그런 것이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 누군가에게 닥친 슬픔을 내 슬픔처럼 공감해서 함께 슬퍼하는 것.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 내게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일까. 어떤 슬픔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녔는데, 나만의 얕은 그릇을 통해 지레짐작할 수 있는 것일까. 거대한 슬픔 앞에서 나는 대체로 당황하고 만다. 감히 헤아릴 수 없어 머뭇거리고 만다.
여전히 누군가는 죽는다. 9년 전과 작년 10월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누군가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는다. 또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런 뉴스가 끊이지 않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공감의 영역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깊이가 존재하므로.그러니 우리는 단지 기억할 수밖에. 그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 그들이 우리에게는 얼굴도 이름도 불분명한 타인이었을지라도, 어느 누군가의 분인이었다는 것. 어느 누군가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남겨진 사람의 일이다. 애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